보건복지부에 의료단체와 함께하는 대책 회의 개최 촉구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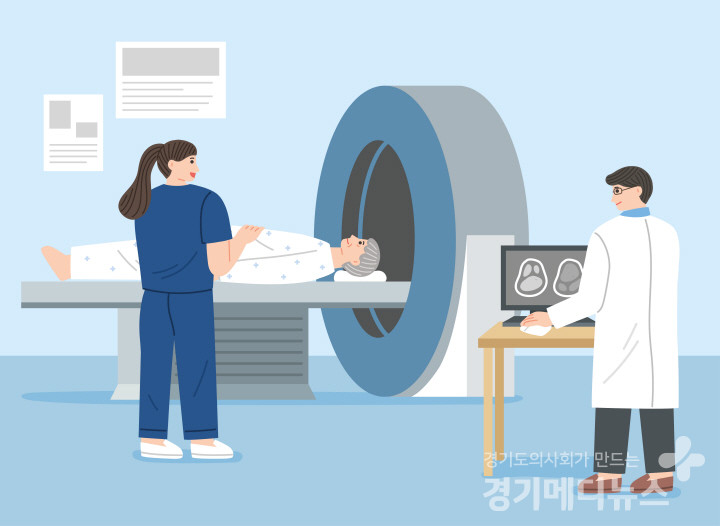
정부가 CT·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개원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
대한개원의협의회(이하 대개협)는 “CT·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으로 현재의 공동활용병상에 폐단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나, 단순히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고 100병상 또는 150병상의 자가 보유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해당 의료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면,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대개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%가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2차 의료기관에서는 CT·MRI를 보유할 수 없어 해당 검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정책 변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.
반대 이유로는 “CT·MRI는 더 이상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,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2차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꼭 시행해야 하는 검사”라는 답변이 67%, “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는 정책이고, 법으로 1차 의료기관·소규모 2차 의료기관의 CT·MRI 보유를 막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”이라는 답변도 29%를 차지했다.
또한, 응답자의 69%는 “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서도 CT·MRI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”라고 주장했다. 공동활용병상제의 폐단이 있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17%에 달했다. 100병상 또는 150병상의 자가 보유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·MRI를 설치하게 하고 공동활용병상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%에 불과했다.
공동활용병상제에 폐단이 있더라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“병상을 갖지 못한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위해서, CT·MRI 검사는 필요하기 때문”이라는 의견이 73%를 차지했다.
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 CT·MRI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61%가 “전문 과별 진료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”라고 답했고, 30%는 “의료기관별 진료 전문의 수 또는 전문병원 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”라고 답했다.
한편, 응답자의 64%가 “의원과 중소병원에서 병상수를 줄이고 있는데, 공동활용병상제의 충족 기준은 CT·MRI 각각 200병상으로 변화가 없어 충족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”라고 답했으며 30%가 “공동활용병상 인프라가 공개되지 않아 개인이 공동활용병상을 찾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불필요한 시간 투자 등이 수반돼야 한다”라고 답해 현 공동활용병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.
대개협은 “지금도 CT나 MRI 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환자가 병상수 많은 대규모 병원으로 몰리고 있고, 긴 대기 시간을 기다리며 새벽 시간을 이용해 겨우 검사받는 실정”이라며 “사정이 이런데도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수가 적은 소규모 병원이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로 인해 원천적으로 CT·MRI 검사 장비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면, 환자들은 필수적인 검사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,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는 더 이상 환자가 찾지 않게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”이라고 우려했다.
이어 “합리적인 수준의 CT·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”라며 “보건복지부에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”라고 호소한 뒤 “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대개협을 비롯해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인 의료단체와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하라”라고 촉구했다.


